
지난 달 28일, 자국의 ‘월드컵’ 개최에 들뜬 한국의 ‘축구팬’들에게 쇼킹한 사건이 있었다. 한국 대표팀의 간판 스트라이커 황선홍(34. 가시와)이 은퇴를 선언 한 것이다. “후배 선수들을 위한 당연한 은퇴”라는 그의 소감 이면에는 그가 지난 14년간 함께 해 온 ‘태극마크’에 대한 구구절절한 한국축구의 애환이 서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988년 약관의 나이에 태극마크를 단 황선홍은 183cm의 신장에는 보기 드문 골 감각으로 고질적인 문전처리 미숙이라는 한국팀에 해결사로 명성을 떨쳤다.
황선홍의 대표시절은 월드컵 연속 출전 이라는 ‘한국축구호’에 희망의 뱃고동 소리가 울리던 시기였다. 월드컵을 목전에 둔 국민들은 ‘거함’의 ‘진수식’을 환영하듯 대표팀을 찬양했다. 그러나 냉혹한 세계축구의 ‘거친 바다’는 번번히 ‘한국팀’을 좌초 시켰고, 언론과 국민들은 그들을 위로하기 보다는 기다렸다는 듯이 삿대질을 해댔다.
황선홍은 1990년 월드컵과 19998년 월드컵에 이르기 까지 3회 연속으로 월드컵에 출전 하면서 비슷한 상처를 경험했던 것이다.
1992년 분데스리가를 거친 황선홍은 1993년 포항스틸러스에서 활약, 1995년 골든볼을 수상 하기도 했고, 1998년 일본J리그 세레소 오사카팀에 이적 1999년 J리그에서 24골로 득점왕에 등극하는 등 아시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우리는 황선홍이 28일 밝혔던 은퇴 선언에서 ‘국가대표 은퇴’라는 꼬리표를 단 사실을 주목해야한다. 어쩌면 국민들의 기대가 부담으로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국가대표 라는 책임감을 벗어나려는 그의 마음 한켠에는 지난 14년간 되풀이되었던 한국축구에 대한 국민들의 변덕 스러운 애정에 대한 뒷 공포(?)가 깔려 있는지 모른다.
어디 황선홍 뿐이겠는가? 만약, 본선에서의 결과가 국민들의 기대에 충족치 못했더라도 이제는 구태를 버려야 한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사랑을 보여야 한다. 축구 종가 잉글랜드와 세계 랭킹 1위인 프랑스전에서의 선전을 되새기며 “그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힘 내라”고 격려하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16강 진출에 대한 기대 만큼이나 16강 좌절에 따른 후유증에 대해서도 관대한 애정이 절실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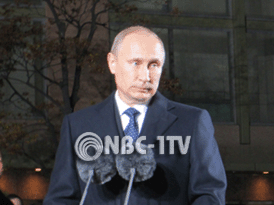


![[방송]칼 구스타브 16세 스웨덴 국왕 내외 '판문점 방문'](/data/photos/201206/tp_4985_1338541762.gif)
![[방송]아베 일본 총리,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data/photos/20180206/art_15182509707316_ea1725.gif)
![[방송]율리아 티모셴코 우크라이나 총리 '현충원 참배'](/data/photos/200911/tp_1469_1258222657.gif)
![[방송]덴마크 프레데릭 왕세자 레고월드타워 완공식 참석](/data/photos/201205/tp_4820_1336960396.gif)
![[방송]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 '한강 풍광에 감탄 연발'](/data/photos/201112/tp_1773_1323148112.gif)
![[방송]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 경복궁 ‘삼매경‘](/data/photos/201502/tp_11564_1424875669.gif)
![[방송]실비아 스웨덴 왕비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방문](/data/photos/201206/tp_4973_1338609768.gif)
![[방송]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 헬기로 '판문점 방문'](/data/photos/201104/tp_2671_1303638987.gif)
![[방송]버락 오바마 대통령 '美 장병들 격려 연설 후 출국'](/data/photos/200911/tp_1482_1259418098.gif)